회화 감각 - 고전적이고도 현대적인
허미자展 / HUHMIJA / 許美子 / painting
2023_0217 ▶ 2023_0226 / 월요일 휴관

초대일시 / 2023_0217_금요일_05:00pm
후원 / 갤러리 내일_내일신문
관람시간 / 11:00am~06:00pm / 월요일 휴관
갤러리 내일
GALLERY NAEIL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내일신문) B2
Tel. +82.(0)2.2287.2399
나는 풀이고 꽃이다. ● 1. 찬 바람이 불면 만물이 움츠러든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풀과 꽃은 바닥에 몸을 바짝 누인다. 뜨거운 태양과 풍요로운 생의 환희 속에 빚어진 사건들, 감정들이 깜박거리며 망각의 세계로 돌아가면 남겨진 것들은 마치 겨울잠을 자듯 깊이 고개를 숙인다. 곤충이 찾지 않는 계절의 풍경이다. 살아 움직이는 거들이 모두 숨죽이고 어디론가 숨어들어 간 차갑고 무거운 계절을 견디는 생명들이다. ● 허미자 작가의 작업은 풀과 꽃의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풀과 꽃은 이름이 없다. 아무 나거나 무명씨다. 그냥 풀이고 그냥 꽃이다. 치열한 자연생태의 생존자들이다. 승리자들이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미미한 존재들은 자연의 숨결이기도 하다. 대지의 호흡이다. 작가의 이름 모를 풀과 꽃은 작가 자신의 초상이며 작가의 삶을 거울처럼 비춘다. 작가는 내가 누구인지 찬찬히 살펴본다. 생의 기쁨보다 생의 슬픔과 무거움을 느낀다. 납작 몸을 낮추고 있는 잡풀과 들꽃이 존재의 깊은 중력을 은유한다. 대지와 하나가 될 정도로 무거운 삶과 운명의 중력을 온몸으로 견디어낸다.



생각해보면 인류가 직립보행과 언어를 통해 사회를 형성한 이래 이름(짓기)란 존재에 대응하는 것으로 존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있다는 제자의 글을 보고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며 제자의 게으름을 혼냈던 늙은 선생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 쇠드 기풀, 진드기 풀, 말똥가리 풀, 여우각시 풀, 쑥부쟁이, 구절초, 노루오줌, 엉겅퀴, 달개비, 개망초, 냉이 족두리 꽃, 도둑놈 각시 풀, 보리꽃, 감자꽃, 개망초꽃. 인류가 염원한 꿈과 소망을 담은 이름들이 있다. 그러나 자연을 잃어버린 도시생활자들은 이름과 이름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을 연결하지도 구별하지도 못한다. 녹색의 푸른 것은 풀이고 알록달록한 것은 꽃이다. 풀과 꽃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절이다. ● 그림 속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은 겨울밤 달빛을 품고 있는 것만 같다. 낮은 소리와 울림으로 자신이 살아내고 있다는 거대한 진실을 소박하게 뿜어내고 있는 것만 같다. 잡풀과 들꽃이 불러일으키는 상념들이 그림 밖에 마치 소박한 풀 내음처럼 퍼진다. 풀과 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설켜 하나의 운명으로 거듭난다. 망각과 윤회의 강을 함께 건넌다. 이 이미지는 '존재의 식물성'을 사유한다. 식물적 감각과 감성이 화면 깊이 안개처럼 깔린다. 그렇게 길을 가다 눈을 돌리면 어디서나 눈에 밟히는 풀과 꽃들이 있다. 거기에 존재한다.



2. 허미자 작가의 이번 이미지들은 점점 더 깊은 사색의 바다를 모험하는 듯 보인다. 오랫동안 그림 그리기를 통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작가 자신과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의 풍경에 가까이 다가간다. 작가는 전통적인 재현으로서 회화의 미덕을 따르면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풍경을 담으려고 한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다채롭지도 않은 소탈한 이미지들이다. 찬찬히 그리고 섬세하게 깊이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지만 분명 생명의 활달함을 품었을 이름 모를 풀과 꽃을 표현하고 있다. ● 그러나 그 표현이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안으로 말려들어 가며 자신의 온몸으로 품는 에너지의 표출이다. 작가의 이미지는 안으로 품는 표현이다. 자연은 깊은 침묵의 바다와 같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낮음'과 '이름 없음'이 허미자 작가의 그림 속에서 거대한 고래가 울음을 토하듯 거대한 저주파가 되어 떨린다. 물리적 시간의 경계 끝단까지 나아가 일시적인 순간과 그 순간의 시간 들이 통합된 원형적 시간(성)에 가 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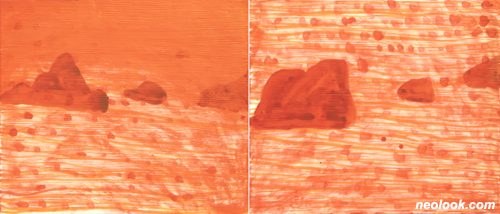


억 조의 생명을 품은 풀이고 예쁜 꽃이지만 이름이 없다. 구약의 만물이 음과 양의 짝을 이루고 신과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 이름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여성의 시각과 말이 거세되어온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이름이 없거나 비루했다. 자매들, 우리의 누이들은 이름 없이 일생을 보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시간 들을 지나간다. 상처 받은 존재의 자의식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망각된 자연의 자녀들은 인류 문명의 깊은 좌절과 실패를 상징한다. 하얀 눈에도 수십 개의 이름이 다르고 같은 풀과 꽃이 계절마다 이름이 달랐던 시대의 순수하고 소박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회화가 자연과 만나는 것은 오랜 문화이다. 시원을 알 수 없는 시간을 거쳐 온 자연, 생명, 변화가 인류의 문화로 스며들어와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거듭 부활하는 활달한 생명 에너지는 회화 이미지를 생동하게 만든다. 나무와 풀과 꽃 등 온갖 생명체는 태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회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되어왔다. 작가가 꽃과 나무와 풀을 지치지 않고 그리는 이유이다. 허미자 작가의 그림에는 세상살이의 경험과 작가로서 겪어온 시간이 소탈한 이미지에 녹아 있다. 세상이 모두 잠든 계절, 지금 여기서 작가는 자기 자신이 풀이고 꽃이라는 화두를 떠올린다. ■ 김노암
Vol.20230217b | 허미자展 / HUHMIJA / 許美子 / painting
'인사동 정보 > 인사동 전시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문자展 '사유공간 Speculation Space' (0) | 2023.02.24 |
|---|---|
| [안영배의 웰빙풍수] 열두 띠를 풍수와 사주로 풀면? (0) | 2023.02.22 |
| 키미작展 'ARE YOU READY' (0) | 2023.02.13 |
| 성태훈展 '선유도 왈츠 Seonyudo Waltz' (0) | 2023.02.11 |
| 무장지대 / MILITARIZED ZONE in KOREA展 (0) | 2023.02.08 |